어릴 때부터 ‘태극당집 손주’로 불렸다. 1946년에 명동에 문을 연 서울 최초의 빵집 태극당. 창업주 故 신창근씨의 장손 신경철(34) 태극당 전무이사의 삶은 어찌 보면 처음부터 결정돼 있었다. 그는 태극당이 1973년 장충동으로 본점을 옮기고서도 12년이 지난 뒤에 태어났다. “늘 태극당이 마냥 좋았다”고 말한다. 주말마다 온 가족이 빵집을 찾았다. 본점 건물 3층에 할아버지가 살았다. 밤마다 카스테라를 야식으로 먹었다. 아버지는 카스테라를 자르고 남은 조각을 매일 싸갖고 왔다.
‘언젠가는 빵집을 맡겠지’ 라고 막연히 생각했다. 공부보다는 힙합과 패션에 관심이 많은 '말 안듣는 아들'이었다. ‘철이 든’ 건 2012년, 빵집 카운터를 보기 시작하면서다. 늘 주말에 북적이는 빵집을 보고 자랐는데, 들여다 본 실상은 충격적이었다. “카페 매출이 0원인 날도 있고, 비가 오면 빵집 전체 매출이 100만원이 안 나오기도 했어요.” 태극당이 문을 닫을 거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던 그다. “이렇게 해서 계속 문을 열 수 있을까, 하는 충격이 심했어요. 그 뒤로 잘 쉬지 않게 되었죠.” 처음 몇년은 한달에 하루도 쉬지 않고 가게에 나왔다. 요즘도 한달에 사나흘 정도만 쉬고 있다.
![2015년 매장 리모델링에 들어가기 전의 태극당 매장. 리모델링 뒤에도 대형 샹들리에와 원목 마감, '태극식빵' 간판 등을 고스란히 살렸다. [사진 태극당]](https://pds.joins.com/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1902/07/8f3a22e6-596f-41dd-8072-37376a7cbb5c.jpg)
2015년 매장 리모델링에 들어가기 전의 태극당 매장. 리모델링 뒤에도 대형 샹들리에와 원목 마감, '태극식빵' 간판 등을 고스란히 살렸다. [사진 태극당]
충격은 연이어 왔다. 2013년 갑자기 가게 운영을 맡게 됐다. 할아버지에 이어 가게를 운영하던 아버지(신광열씨)가 뇌출혈로 쓰러졌다. 그리고 한달 뒤에 할아버지가 별세했다. 갑작스러웠지만 무엇을 해야 할지는 알고 있었다. 1년 동안 카운터를 보며 적어 온 메모를 꺼냈다. 두 누나와 함께 세 남매가 뭉쳤다. “뭐라도 해야겠다, 안 그러면 우리가 태극당을 문 닫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 뿐이었어요.”
가장 큰 고민은 고객군이었다. 빵집의 고객은 열에 여덟이 60세 이상이었다. 할아버지 때부터 태극당을 찾았던 고정 고객이었다. 장충동은 유동 인구가 많지도 않았다. 태극당이란 브랜드가 세련되지도 않았다. “세 가지를 바꿔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커피 맛과 핵심 메뉴, 그리고 브랜드입니다.”
![한달 간의 리모델링 뒤에 다시 문을 연 태극당. 인테리어 컨셉은 물론 작은 디테일까지 옛것을 거의 고스란히 살렸다. [사진 태극당]](https://pds.joins.com/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1902/07/aaf66218-fde0-4782-b5d4-5550fc45cfd5.jpg)
한달 간의 리모델링 뒤에 다시 문을 연 태극당. 인테리어 컨셉은 물론 작은 디테일까지 옛것을 거의 고스란히 살렸다. [사진 태극당]
당시 태극당에서 팔던 커피는 ‘다방식’이었다. 커피가 달라지지 않으면 젊은 고객을 잡을 수 없다고 생각했다. 가게를 맡은 지 반년 뒤부터 밤에 바리스타 학원을 다녔다. 커피를 배우니 길이 보였다. “커피 맛을 결정하는 건 원두와 로스팅이라는 것, 그리고 우리 규모로는 전문 바리스타를 채용해 직접 로스팅까지 하는 것은 무리라는 걸 깨달았어요.” 유명 커피 전문점과 원두 공급 계약을 맺었다. 까다로운 20대들도 “최고의 맛”이라고 평가하는 커피를 팔기 시작한 것이다.
핵심 메뉴를 강화하기로 했다. 메뉴과 관련한 그의 생각은 확고했다. 전통을 크게 벗어나선 안된다는 것이었다. 태극당의 대표 상품은 얇은 과자 안에 아이스크림을 채운 모나카 아이스크림, 생크림 중심의 트렌드와는 맞지 않는 버터케이크, 옛날 방식으로 만들고 있는 단팥빵과 야채 샐러드빵이다. 모두 할아버지 때와 같은 방식으로, 40년 이상 일한 제빵사들이 만들고 있었다. “젊은 사람의 입맛에 맞는 제품을 팔아야 하나, 하는 생각도 안 해본 건 아닙니다. 하지만 태극당의 시그니처(signature)라고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는 메뉴는 손대지 않기로 했어요. 빵도 유행을 타는 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행을 좇는 빵집들은 너무 많아요. 손님들이 태극당을 찾는 이유는 70년이 넘은 오래된 빵집에서 추억을 맛보기 위해서라고 생각해요.”
![태극당의 대표 메뉴 중 하나인 버터케이크. 케이크 시장의 트렌드는 생크림 제품이지만, 지금도 태극당의 케이크는 대부분 버터크림으로 만든다. [사진 태극당]](https://pds.joins.com/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1902/07/4cf0c4e9-f722-477b-8903-5a0368546199.jpg)
태극당의 대표 메뉴 중 하나인 버터케이크. 케이크 시장의 트렌드는 생크림 제품이지만, 지금도 태극당의 케이크는 대부분 버터크림으로 만든다. [사진 태극당]
메뉴보다 더 중요하게 여긴 건 브랜드였다. 그는 브랜드를 정식으로 공부한 적은 없다. “하지만 가장 태극당스러운 걸 보여주는 게 브랜딩”이라는 생각은 분명했다. 옛 디자인을 보존하되 제각각이던 로고와 포장 디자인을 통일하기로 했다. 1970년대부터 이런저런 포장지에서 선보였던 무궁화 패턴을 깔끔하게 정리해 디자인했다. 디자인 업체에 의뢰해 자체 서체도 개발했다. 50년대 서울의 한글 간판에서 착안한 ‘태극당 1946체’라는 폰트가 탄생했다. 이런 디자인을 활용해 빵을 새롭게 포장했다. 포장지가 바뀌었을 뿐인데 매출이 두배로 뛰었다.
내친 김에 2015년, 매장 리모델링에 들어갔다. 건물 노후화가 심해 제대로 된 제빵 설비를 들일 수가 없었다. 전기 공급도 달릴 정도였다. 매장은 여전히 수익을 못 내고 있었지만 기존 재산을 헐어 투자를 감행하기로 했다. “자료와 사진을 가지고 가 아버지, 어머니를 설득했어요. 지금 바뀌지 않으면 곧 문을 닫는다는 것, 누군가는 밀어붙여야 한다는 것만 생각했어요.”
![창업주 故 신창근씨의 손자인 태극당 신경철 전무 [사진 태극당]](https://pds.joins.com/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1902/07/e1e161cc-b871-4f13-8409-dde7f4353517.jpg)
창업주 故 신창근씨의 손자인 태극당 신경철 전무 [사진 태극당]
한달 간 문을 닫고 대대적인 공사를 벌였다. 리모델링에서도 가장 중시한 건 옛 것을 그대로 지킨다는 원칙이었다. 태극당의 상징인 거대 샹들리에는 물론 천정과 벽을 두른 붉은빛 원목까지 그대로 남겼다. ‘납세는 국력이다’‘계산을 정확히 합시다’ 같은 오래 된 표어들도 고스란히 살렸다. 제빵사들이 밀가루를 반죽하던 작업대를 2층에 들여 손님들의 테이블로 썼다. 예식장에서 쓰던 장미 문양 의자, 할아버지가 보관하던 40년 넘은 조명이 모두 재활용됐다. 리모델링 소식에 “제발 태극당을 바꾸지 말아달라”고 이메일까지 보냈던 충성 고객들도 리모델링의 결과물을 보며 흐뭇해했다.
그저 옛 것만 지키는 것은 아니다. 젊은 고객에게 태극당을 알리기 위해 다양한 브랜드와 협업(Collaboration)했다. 대표적인 것이 스트릿 패션 브랜드 브라운 브레스(Brown Breath)와의 협업이다. 브라운 브레스는 힙합을 좋아하는 20대 남성은 다 아는 패션 브랜드다. 태극당의 컨셉을 반영해 패션 제품을 공동 제작했다. 태극당 곳곳에서 협업 제품들을 전시했다. 힙합과 패션을 함께 즐기던 친구들과 자연스럽게 진행한 협업이었다. 이 프로젝트가 계기가 돼 이탈리아 신발 브랜드 슈페르가에서도 협업 제안이 들어왔다. 그는 “전통의 빵집이지만 젊은 사람들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데 젊은 브랜드와의 협업만큼 좋은 게 없다고 생각했다”며 “최근 을지로에 들어선 독립 서점에 태극당의 이름으로 작은 카페를 낸 것도 젊은 고객을 사로잡기 위한 노력”이라고 말했다.
![스트릿 패션 브랜드 브라운 브레스(Brown Breath)와의 협업을 알린 스티커. 인테리어부터 포장지까지 전통을 지키지만 젊은 브랜드와 협업해 새로움을 부각한다. [사진 태극당]](https://pds.joins.com/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1902/07/e54d7d4c-0865-480f-9a33-0dba2fa7284a.jpg)
스트릿 패션 브랜드 브라운 브레스(Brown Breath)와의 협업을 알린 스티커. 인테리어부터 포장지까지 전통을 지키지만 젊은 브랜드와 협업해 새로움을 부각한다. [사진 태극당]
이런 노력 끝에 빵집 매출은 그가 운영을 맡은 이후로 세배 이상으로 올랐다. 그의 다음 목표는 해외 시장이다. ‘서울에서 가장 오래 된, 가장 한국적인 빵집’이라는 스토리라면 외국인들을 사로잡을 수 있을 거란 판단이다. “오래된 가게지만 저는 스타트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늘 무모하게 보이는 도전을 지속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올해는 좋은 투자자를 만나고 싶어요. 기존의 단계를 넘은 확장을 해보려고 합니다.”
태극당은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을까. “그저 오래된 브랜드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지킬 것은 지키면서 시장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는 브랜드가 필요하겠죠. 이런 원칙을 지킨다면 200년, 300년 동안 이어지는 브랜드를 만들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그는 2016년 아이를 낳았다. ‘태극당집 증손주’가 자라고 있는 것이다.







![제352호 [2024년 12월]](https://caual.com/files/thumbnails/053/064/220x311.crop.jpg?20241126120438)
![제351호 [2024년 9월]](https://caual.com/files/thumbnails/465/063/220x311.crop.jpg?20241211152322)
![제350호 [2024년 07월]](https://caual.com/files/thumbnails/878/062/220x311.crop.jpg?202407291647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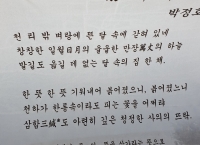








![[백남기 열사 추모비 건립 서명운동]](https://caual.com/files/thumbnails/834/041/200x145.crop.jpg?20190901144110)

